문학의 고장 영양이 낳은 작가 이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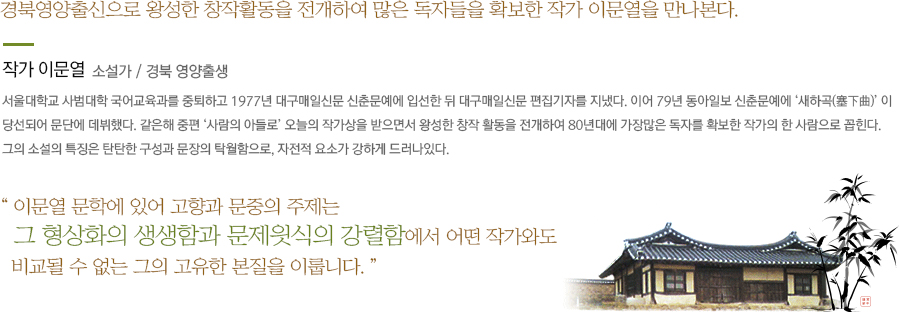
이문열에게 고향과 문중의 의미
이문열이라는 작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길게 언급할 수는 없으되 그의 고향과 문중의 인물 및 역사를 세부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영웅시대』의 이동영과 이동영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대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리』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들과 『황제를 위하여』에 드러나느 과거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문열의 세계관과 정치적 무의식, 나아가 이문열 문학의 문제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문열 문학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이문열 문학이 세계문학 속에서 좀더 평가를 받고 이문열 문학 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좀더 평가를 받으려면 분단문학이라는 국지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르케스 같은 사람은 남미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문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지만 아무도 저항문학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에 겐자부로가 『만년원년의 풋볼』에서 안보투쟁의 여파에 대해 썼지만 안부투쟁의 여파라고 개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제를 위하여』라든지 『금시조』라든지 『시인』이라든지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모습들을 그리려고 노력했던 그 점이 더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사회는 불과 40년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 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때 두 세대에 걸쳐 국민소득이 2배가 되었는데 우리는 한 세대만에 8배를 만드는 굉장한 역동성을, 세계의 유리가 없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눈이 뒤따르기 힘든 변화속에서 인간이 기품있게 또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한 이문열 문학은 그의 성장의 기반이었던 재령이시 영해파라는 문중으로부터 오는 여러가지 가치관들과 소중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단체제와 산업사회의 현실에 적용시키고 비추어 보면서, 문학의 보편적인 정신들을 발견해내는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인화(소설가,이화여대 교수)
영광을 고향에 돌리는 소설가
내가 이만큼 글을 쓰는 것도 고향을 잘 만났기 때문 이라고 말했지만, 과거 우리 누구나를 감싸안았던 공동체의 이야기다. 왜 하필 장애인인 당편이가 주인공인가, 누구나 기억하겠지만 그 시절 우리 마을에는 꼭 한두 사람의 이른바 '바보'혹은'반편'이 잇었다. 그들의 바깥에는 생상적 노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역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장애자들이 있었고, 더 바깥에는 완전한 심신의 상실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이루었다'는 이씨는 그 시절의 공동체 구조를 '양파'에 비유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껍질 한껍질을 이루는 맨 안쪽에 소위 정상인들이 존재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모두가 정상인이다. 온전하지 않으면서 온전하다고 우기는 정상신들이 꾸려가는 공동체이지만 그 한껍질만 벗겨내면 이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씨가 이번 소설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한 사회적 존재가 단지 '거기에 있다'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기호(記號)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싶었다 고 그는 말했다.
하종오 기자/ 한국일보


